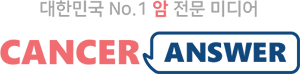사람의 몸은 오래 달리기에 적합하도록 진화했다.
그러므로 오래 달리기를 해야 우리 몸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활용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현실 속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질병과 고통, 심지어 갈등까지도 여기서 출발한다는 이론도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래 달리기를 해야 한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유명한 책 <호모 데우스>에서 호모 사피언스의 멸종을 이야기한다. 뭐, 핵전쟁을 통한 인류의 멸절이 아니라, 현생 인류의 아주 다른 진화, 인체의 기계화 같은 것이다. 머리에 헤드폰과 고글을 쓰고, 귀에 이어폰을 꼽고, 첨단기능의 슈트를 입고 화재를 진화하는 소방관의 모습? 영화 속 미래 경찰의 모습?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이보그 비슷해진 포스트 호모 사피언스의 모습이란다. 유전공학과 인공지능의 발달이 뼈와 살이 살아있는 우리 몸을 대체한 신인류로 나아갈 것이란다.
자, 이제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몸이 제 기능을 하도록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계속 살아갈 것인지, 2050년 몸의 기능을 포기하고 과학의 옷을 입어야 살아가는 신인류가 될 것인지. 우리 몸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다면,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바로 달리기다.

순전히 달리기로만 사슴 사냥하기
뛰어야 사람이다. 이 간략하고 파워풀한 명제를 던진 책 <본투런>을 통해 몇 가지 더 진화와 달리기의 관계를 살펴보자. 왜 달려야 인간인지 좀더 과학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사실, 자연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동물 중 하나다. 토끼나 사슴보다 늦고, 사자 호랑이 같은 대형 포식동물은 물론이고, 여우나 개보다도 약하다. 그렇다면, 곡물을 재배하기 전의 인류는 어떻게 음식을 해결했을까. 지금처럼 몸집이 커지기 위해 꼭 필요한 단백질은 또 어떻게 섭취했을까.
그 정답은 바로 달리기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 종족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사슴은 사람보다 빨리 뛰지만, 사람보다 오래 뛸 수는 없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슴 중 하나를 타깃으로 삼아 그 사슴을 몰면서 달리기 시작한다. 허겁지겁 뛸 필요는 없다. 그냥 시선 안에만 넣어두면 된다. 사슴이 후다닥 도망가다 쉬면서 눈치를 살피면 또 다가가고, 또 더 가까이 다가가 쫓고, 또 더 가까이 다가간다. 그렇게 한 시간, 두 시간을 가면 사슴은 지쳐 쓰러진다.
그때 사람들이 그 사슴을 들고 다시 한두 시간을 뛰어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 도중에 해체하거나 잡아 먹으면 피 냄새를 맡은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된다.
그렇게 서너 시간을 무리지어 달리는 것이 오늘날의 인간을 만들었다. 구석기 이전의 시대에 몸집이 폭발적으로 커진 비결을 원시부족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뒷목인대-아킬레스건, 인간만 갖는 강력한 달리기 무기
이렇게 먹고 살면서 몸집을 키우는 진화가 가능했고, 그 과정에서 점점 잘 뛰는 사람, 점점 오래 뛸 수 있는 사람으로 진화해 갔다. '본투런'은 이렇게 설명한다.
목덜미 인대는 동물이 빨리 움직일 때
머리를 고정시키는 데만 사용된다.
걷는 동물은 목덜미 인대가 필요 없다.
큰 엉덩이도 달리는 데만 필요하다.
아킬레스건도 마찬가지다.
아킬레스건은 걷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침팬지는 아킬레스건이 없다.
4백만 년 전의 반(半)유인원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아킬레스건이 없었다.
아킬레스건의 흔적은 2백만 년 후
호모 에렉투스에서부터 나타났다..........
인간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했다.
인류는 달리는 동물의 주요 특징을 채택했다.
'털없는 원숭이'라는 책이 있다. 데즈먼드 모리스의 이 유쾌한 책 제목은 현대인의 짐승적 위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 용어이지만, 사실, 달리기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털없는 피부, 연약한 피부가 맹렬한 태양 아래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지만, 달리기를 위해서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된다. 피부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사슴보다, 치타보다, 심지어 말보다 더 오래 잘 달릴 수 있는 것이다. 혀로 땀을 배출해야 하는 개가 조금 뛰고 나면 혀를 내밀고 헉헉거리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그냥 피부로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래 달리기를 위해서 땀흘리는 피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인체, 즉 사람 몸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한가지 사실로 귀납된다. 바로 그 특징들 대부분이 달리기를 위해 진화된 것이라는 점. 그래서, '본 투 런' 사람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사람은 잘 달리도록 진화했다는 말이 가능한 것이다.
관련기사
- [달리기와 진화 1] 사람은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 [달리기와 인문학 1] 무라카미 하루키, 가장 낭만적인 마라토너
- [달리기의 기술 1] 달리기 '착지법' 알고 뛰세요
- [달리기의 기술 2] 러닝머신 제대로 뛰는 비법 10
- [달리기와 인문학 2]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 [안전한 달리기 1] 타이거 우즈 "너무 달려 무릎 상했다"고?
- [달리기와 진화 3] 두꺼운 운동화 탈출, 맨발로 달려볼까?
- [달리기의 기술 3] 다이어트 끝판왕 인터벌 달리기
- [안전한 달리기 2] 제대로 뛸 때 알아둘 '달리기 안전수칙 8가지'
- [달리기와 인문학 3] 뼈암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청년의 '캐나다횡단 마라톤'
- [안전한 달리기 3] 코로나19-변덕날씨, 야외달리기 안전수칙 7가지
- [달리기와 진화 4] 고양이 vs 개, 왜 그들은 다르게 뛸까
- [안전한 달리기 4] 마라톤은 '과격한' 달리기, 심폐소생술은 아시죠?
- [달리기와 인문학 4] 다이어트를 꿈꾼다면, 35kg 뺀 이 남자를 보라
- [달리기의 기술 4] 오래달리기는 팔로 한다?
- [달리기와 진화 5] 달리기가 여성에게 좋은 7가지 이유
- [달리기와 진화 6] 동물들의 놀라운 '장거리 달리기' 능력
- [달리기와 진화 7] 오래 달리는데 필요한 '2:2 호흡법'
- [달리기와 진화 8] 달리기의 이종사촌, 파르쿠르를 아시나요?
- [달리기와 진화 9] '면역력의 창고' 내장을 살리는 달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