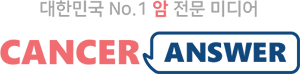아마도 내가 4살 혹은 5살이었을 것이다. 겨울잠바를 새것으로 처음 획득한 때가 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이었으니까 계절은 분명 겨울이었을테고.
아버지가 우리 형제를 데리고 속초에서 고향 남해로 가려던 참이었던 것 같다. 내가 태어나 아버지의 고향집으로 처음 방문하는 것이니 까까옷으로 겨울잠바가 마련된 것이었다.
출발하는 어느 날 새벽, 나에게 생애 처음으로 겨울잠바가 입혀졌다. 그 전에도 겨울잠바를 입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새것으로는 분명 처음이었다. 새 겨울잠바는 황토색이었고 속에 솜이 들어 있어 폭신폭신했고, 소매와 허리춤은 쫄쫄이로 죄어져 있었다.
내가 지퍼를 잠글 줄 몰라서 아마 엄마가 채워 주셨을 거고, 오래 입을 수 있도록 내 체구에 비해 무척 넉넉했지만, 너무 좋은 나머지 몸이 날아갈 듯했다. 그래서 오두방정을 떨며 내가 먼저 대문을 열고 신작로로 뛰쳐나갔다. 진짜 날아갈 듯이.

등 뒤에서 누군가 “넘어진다, 조심해”라고 소리친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대문 밖으로 10미터도 못 가서 철퍼덕 자빠졌다. 겨울 눈이 녹았는지, 겨울비가 왔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질퍽한 물웅덩이에 그대로 자빠진 것이다.
그렇게도 뽐내고 싶었는데... 그 첫 겨울잠바와 함께 차갑고 질퍽한 겨울 땅바닥에 자빠졌으니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내 마음은 차가운 냉기에 얼어붙고 말았다. 어린 꼬마의 마음엔 행운이란 이렇게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는가 보다 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적당히 닦아서 얼룩진 잠바를 입고 남해로 갔겠지...
여섯 살 때 아버지 장례식날.
겨울이 이미 지난 후에 뒤늦게 선물 받은 새 털장갑이 있었다. 장갑을 껴보지도 못하고 자랑도 못한 채 고이 모셔두고 있던 것을 지금이 기회다 싶었다. 계절은 봄.
병풍 뒤에 고이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마지막 절을 하라는 말에 나는 준비하고 있던 털장갑을 멋지게 끼고 무대 중앙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장갑이 잘 보이도록 두 팔을 뻗어 큰절을 하려는 찰라, 뒤에 있던 누군가가 갑자기 나를 붙잡고는 장갑은 벗고 절하는 것이라고 엄숙하게 타일렀다. 어쩔 수 없이 장갑을 벗고 맨손으로 아버지께 절을 했다.
무안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다. 어린 꼬마의 마음엔 함부로 자랑질을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국민학교 2학년 겨울이었을 거다.
설악산에서 삭풍이 불어닥쳤던 그 겨울 나는 겨울잠바를 입고 다니지 않았다. 나에겐 황토색 겨울잠바가 하나 있었지만, 내 생애 처음 받은 새 겨울잠바였기 때문에 이미 내 몸엔 작았고 여기저기 헤지고 소매와 허리 쫄쫄이도 다 터져서 속에 있던 고무줄이 삐져나왔다.
산지 4~5년 된 황토색 천은 더 바랠래야 바랠 수가 없었고, 그 즈음 친구들은 이미 칼라풀한 잠바를 입고 다녔다. 여섯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내겐 새 겨울잠바는 없었다.
나는 그 낡은 잠바가 너무 입기 싫었고, 친구들에게 나는 “잠바 안 입어도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 다 헤진 내복 위에 긴 팔 옷 하나만 입고 다니면서 나름 영웅처럼 보이고 싶었다.
겨울방학이 끝나고 맞은 개학 날 아침. 그날은 유난히 더 추웠던 것 같았는데 엄마는 그 누더기같은 잠바를 입고 등교하라고 하셨다. 물론 나는 극구 반대했다. 그때는 내 고집이 참 셌다. 그래도 엄마는 억지로 그 잠바를 입혔다.
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내가 이걸 입고 학교에 가면 얼마나 창피할까? 아니야, 추운 것보다는 자존심! 나는 “안 입어!”하고 잠바를 내팽개치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 등 뒤에서 “거기서!” 하는 큰 형의 성난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어 뒤돌아보니 큰 형이 그 겨울잠바를 들고 뛰어왔다. 소아마비로 한 쪽 다리가 불편한 큰 형이 절뚝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놀라서 어리둥절 서 있는데 큰 형이 다가오자마자 한 방의 발길질을 내 복부에 타격했다.
"입고 가!" 나는 차가운 겨울 땅바닥에 큰 대자로 자빠졌고, 멈춰진 내 심장 위로 그 낡은 겨울잠바가 떨어졌다. 큰 형에게 처음으로 맞은 것 같다. 그것도 발길질로 배 한 가운데를. 그전에도 이후에도 큰 형에게 맞은 적은 없다. 정말 벌러덩 자빠졌고, 등 뒤로 언 땅의 매운 맛이 느껴졌고, 아파서 그랬는지 창피해서 그랬는지 울음이 터져 나왔다.
등교하는 친구들이 나를 불쌍하게 쳐다보면서 지나갔다. 다들 겨울잠바를 입은 채...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너무나 황당하면서도 분이 났다. 나는 몸을 탈탈 털고 일어나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을 애써 외면하면서 이 잠바를 어찌해야 할지 잠깐 고민했던 것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대문 밖에서 집안의 동정을 몰래 살피다가 큰 형 모르게 잠바를 던져 놓고 학교로 도망쳤던 것 같다. 결국 그해 겨울엔 겨울잠바 없이 보냈다. 황토색 겨울잠바는 그 이후로 절대 입지 않았다. 고집이랄까 깡이랄까... 어릴 땐 그게 좀 셌다.
우연이겠지만 나의 첫 겨울잠바를 처음 입을 때도 자빠졌고 마지막에 입을 때도 자빠졌다. 처음 자빠졌을 때는 아깝고 아쉬웠는데, 마지막 자빠졌을 때는 억울하고 서러웠다.
낮에 명상을 하는데 갑자기 어릴 적 겨울잠바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주룩 흘러나왔다. 기억 저 편에 숨어 있었던 그것이 어린 시절 커다란 트라우마였음을 깨달았다. 아홉 살 꼬마가 추위를 참아내며 지키려 했던 자존심, 아버지가 없어도 비굴하지 않으려 했던 그 꼬마의 자존심이 차가운 겨울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건.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철도 없고 뭣도 모르는 어린 시절. 사소한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어린 마음속 깊이 남겨진 트라우마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가는 줄로 알지만, 그 트라우마는 현재 나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행동 패턴으로 나타난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길은 그것을 바로 인식하고, 그 다음엔 모두를 용서하는 것이리라.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 큰 형, 심지어 차가운 겨울 땅바닥과 설악산 삭풍까지도...
▶하태국 포근한맘요양병원 병원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가정의학 전문의, 통합의학 박사다.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겸임교수이며 유튜브 채널 ‘뜻밖의 의학’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