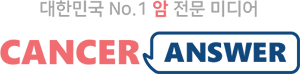어릴 적 고향집 벽에 태엽으로 가는 낡은 괘종시계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최대한 멀리 되돌려 보아도 그것이 벽에 붙어 있었으니 나보다 먼저 태어났을 것 같다.
특별한 고장은 없었지만, 특이한 성격을 지녔던 이 괘종시계는 오래도록 버티다가 내가 중학생 즈음에 유명을 달리하여 버려졌을 것이다.
그 특이한 성격이란, 희한하게도 시계 몸통을 반시계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 놓지 않으면 태엽을 많이 감아 주어도 이내 시계추가 멈추는 것이었다. 기울이는 각도가 절묘하였던지라 조금만 비틀어져도 괘종시계는 투정을 부리듯 작동을 멈추었다.
그 괴팍한 성질을 잘 달래 주는 이가 바로 엄마였다. 반복된 경험 덕분이었든 아니면 시계와 교감을 했든, 도구를 잘 다루셨던 엄마를 우러러보게 만들었던 낡은 괘종시계였다.

때엑땍 때엑땍 때엑땍 때엑땍......
어릴 때는 TV도 없고 라디오는 망가져 있었고, 신작로에 지나다니는 자동차도 드물어서 소음이 거의 없었으니, 방안에 가만히 있으면 오로지 괘종시계 소리만 우렁차게 들렸다. 지구를 자전하게 만드는 동력 기계가 바로 이 괘종시계라고 누군가가 농담으로 말했더라도 아마 믿었을지도 모르겠다.
가만히 시계추 흔들리는 소리를 듣고 있자면, 괘종시계에서 출발한 그 소리가 벽에 부딪치며 방 안을 크게 맴돌고 맴돌다가 어느 순간 아예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마치 괘종시계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그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울린다. 요즘 물리학자들의 전문 용어를 살짝 빌리자면 공간의 왜곡 현상이라고 할까.
때엑땍 때엑땍... 때엑땍......
다른 괘종시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계추 소리가 딱딱거리지 않고 장단에 맞춰 어깨춤 추는 것처럼 들렸다. 최소한 내 귀에는 그랬다. 그러다가도 내가 딴짓을 하고 있으면 시계 소리가 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시계를 쳐다보면 다시 규칙적으로 뛴다. 요즘 물리학자들의 전문 용어를 빌리자면 시간의 왜곡 현상이라고나 할까.
어떤 때에는 시계추 소리가 들리다가 저 멀리 가물가물 사라지기도 하고, 소리가 아예 들리지 않아 “얘가 멈췄나” 하고 뒤돌아보면 시계추는 멀쩡히 그네를 타고 있다.
시계추 소리를 들어보려 애를 써도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면 라디오 주파수 다이얼을 돌리듯 의식의 다이얼을 돌려서 우주의 시공간 어딘가에서 똑딱거리고 있을 괘종시계 요정을 붙잡아와야 한다.
아무도 없는 고요한 방안, 나와 괘종시계 요정 단둘이만 있으면 어느 순간 나는 요정의 최면에 걸려 몽롱한 의식 상태로 들어갔다. 그 시간이 짧든 길든, 방 안의 공간이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시계란 녀석이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왜곡시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들었다. 괘종시계 요정은 까칠하기도 했지만 장난스럽기도 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시절, 하루는 장난감을 만들다가 문구용 칼로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베어 버렸다. 왼손 중지의 살점이 회 뜨듯이 베어져 거의 손가락에서 떨어질락말락할 지경이었다. 상처 부위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다. 어린 나는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아마 길 건너 공장에 일하러 가셨던 것 같다.
집에는 밴드나 붕대 같은 것은 아예 없었고 내 눈에 띄는 건 방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신문뿐이었다. 신문지 한 귀퉁이를 찢어서 피가 흐르는 손가락에 감아쥐었다. 막막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이 떨어진 살이 붙을 수 있을까... 병원에 가야만 하는 걸까. 우리집엔 돈도 없어서 병원에서 영세민이라고 싫어하는데... 엄마가 이걸 보면 얼마나 놀라실까... 머릿속은 복잡하고 두려운 생각들로 뒤죽박죽이었다.
그때 텅빈 방 그 공간에서 내 불안의 안개를 뚫고 때엑땍 때액땍 괘종시계의 소리만 무척이나 크게 진동했다. 그 소리는 이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 시계 소리는 내 머릿속의 잡생각들을 밀쳐내었고, 머릿속에는 오로지 때엑땍 때엑땍 소리만 울리었다.
최면에 걸리듯 이내 잠에 빠져들었다. 한 시간이나 잤을까, 엄마가 들어오는 인기척에 깨어났을 때 어린 꼬마는 방바닥에 새우처럼 쪼그려 누운 채로 신문지로 동여맨 다친 손가락을 여전히 꼭 쥐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 정신이 들자마자 떨어진 살점이 어찌 되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공포심이 밀려왔다. 가만히 조심스럽게 신문지를 벗기었다. 아, 정말 다행스럽게도 베어진 살이 얌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다. 괘종시계 요정의 최면에 빠져 잠들었던 그 짧은 시간에 상처는 거의 치유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린 마음에 깨달은 것은 병원에 안가도 상처가 저절로 붙는다는 사실이었다. 장난감을 조립할 때는 접착제가 필요했는데 살은 그런 거 안 발라도 붙는다는 것이 참 신기하면서도 안심이 되었다. 의대생 시절에 배운 의학 교과서에는 상처가 복구되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잘 설명되어 있지만 어린 꼬마에게는 신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덜 이쁘게 아물긴 했지만 오른손 중지 끝마디에 아직도 베어진 살점이 잘 붙어서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 상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괘종시계 요정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서 우리 몸의 신비로운 치유력을 다시금 각성하게 된다. 우리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그 내적 치유력, 내면의 의사가 그 어떤 의사보다, 그 어떤 약보다 더 지혜롭다는 진실을 말이다.
▶하태국 포근한맘요양병원 병원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가정의학 전문의, 통합의학 박사다. 차의과학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겸임교수이며 유튜브 채널 ‘뜻밖의 의학’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