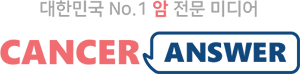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1. 아킬레스. 신이 내린 용사다.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한명. 불사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발목 뒤쪽만이 약점이다. 아킬레스건이다. 그의 엄마 바다의 요정 테티스가 저승의 강에 담가 무적의 몸을 만들 때 발목을 잡고 있어 그 부분이 취약점이 되었다. 하여튼 이 불멸의 아킬레스가 거북이와 달리기 시합을 했다. 누가 이길까.
기원전 490~430년을 살다 간 제논이라는 철학자는 인류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역설 하나를 던진다. 누구나 거짓이라는 것을 알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논술.
워낙 빠른 아킬레스이니까 거북이 10m 앞에서 출발하도록 봐줬다. 과연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제논의 정답은 노(No)다. 아킬레스가 10m를 따라잡으면, 거북은 3m쯤은 더 나가 있다. 또 아킬레스가 3m를 따라잡으면 1m를 나가있고, 1m를 따라잡으면 30cm쯤 나가있고.... 그렇게 무한 반복되면서 절대로 아킬레스는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 아직까지도 '수수께끼의 궁극적 사례'로 불리는 전설적인 이야기다.
고대 그리스와 달리기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첫 에피소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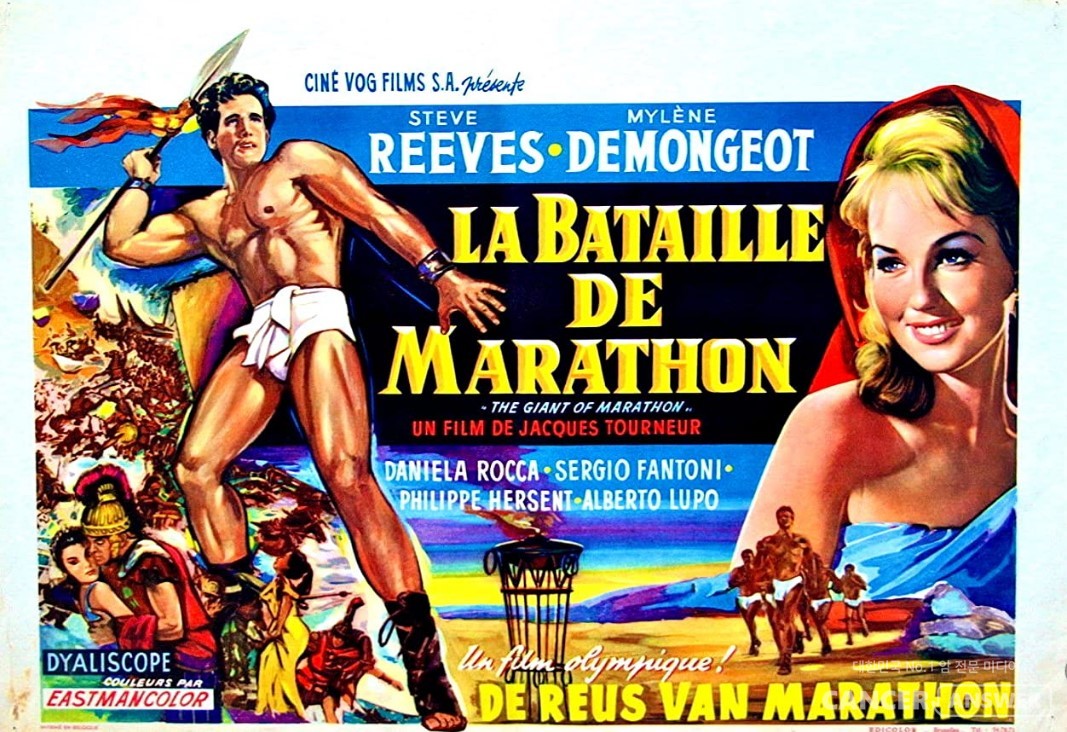
#2. 모든 역사가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기원전 490년경 그리스의 마라톤 평원에서 벌어진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를 서술하면서, 스파르타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단 하루만에 아테네에서 스파르타까지 달련간 피디피데스(Phidippides. 페이디피데스Pheidippides 혹은 필리피데스 Philipides라고도 한다)라는 전령을 언급했다. 전갈을 마친 뒤 아테네로 돌아갔을 터이니 약 290마일을 달린 셈이다. 그는 나중에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아테네까지 달려가 전한다. 그리고 탈진해서 그 자리에서 숨졌다고 한다. 그를 기념해, 혹은 마라톤의 승리를 기념해 마라톤 대회가 창시됐다.
마라톤은 아테네에서 북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지역의 이름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달리는 사람이 이 정도를 뛰고 죽었다는 것은 사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전설이라는 학설이 많다. 전투를 치러 지친 상태에서 목숨 걸고 뛰었다면 죽을 수도 있지만, 전령을 귀하게 대우하는 전통으로 보면 그 또한 현실성이 적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모두 피디피데스라는 전령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그가 마라톤의 또다른 영웅임을 알고 있다. 그를 기념해 마라톤 대회가 생긴 것 또한 사실이다. 1896년 올림픽에 처음 채택된 육상경기 종목이 바로 마라톤이다.
아, 피디피데스가 스파르타로 질주하는 동안 판신이 나타나 아테네의 승리를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를 기리기 위해 아테네에서는 횃불을 들고 달리는 행사를 해마다 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3. 레슬링 선수였던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를 생각하면서 '스타디움에서 60스타디아(약 13km)를 달리는 경주와 야외에서 100스타디아(약 20km)를 달리는 크로스컨트리 경주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의 대 철학자들도 달리기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말들을 남겼다. 소크라테스는 달리기 선수들이 다리가 너무 발달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상국에서는 크로스컨트리 경주가 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달리기의 기법과 훈련 방법을 서술하고 과도한 훈련을 경고하는 등, 달리기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했다. "장인정신 같은 도덕적 미덕은 연습과 습관화로 얻어지는 것이다(Moral virtues, like crafts, are acquired by practice and habituation)." 이런 말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 운동 기술 예술에 해당하는 말이다.
그리스의 민주정 기틀을 세운 아테네의 유명한 정치인 솔론은 그 도시에서 가장 잘 뛰는 소년들을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또한 젊은이들에게 달리기를 단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단련을 통해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특히 거리가 아주 길 때, 호흡과 체력을 아껴서 종착점까지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단거리를 달린다면, 가능한 한 최고의 속도로 주파해야 할 것입니다. 개천이나 도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무거운 납덩이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토르 고다스, <러닝- 한편의 세계사> 책세상 발행, p70)

모든 나라에서 그러했듯 달리기는 사냥과 전쟁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스에서는 주자들이 갑옷을 입고 2~4스타디아(500m 안팎)의 거리를 뛰는 '장갑보병 경주'가 있었는데, 전쟁을 모방한 것이었다. 또한 전쟁 승리를 기념해 열린 '자유대회'에서는 완전무장하고 15스타디아(3km 안팎)를 달렸고, 우승자는 최고의 그리스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 승리는 그리스의 통일성을 상징했고, 산자와 죽은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연결고리라고 믿었다.
그래서, 그 우승자가 나중에 다른 대회에 참가했다가 지게되면, 그리스 사람들이 행운을 잃게 된다고 생각해, 즉시 처행한다는 가혹한 규칙도 있었다. 이럴만큼 그리스에서 달리기는 중요한 것이고, 의미 있는 행사였다.
시간과 거리를 재는 것보다는 달리기 능력을 비교하기를 좋아했던 그리스인들. 그래서 '산토끼를 잡을 수 있을만큼 빠른가?' '장거리를 뛰면 말을 이길 수 있을까?" 같은 비교를 했고, 제논의 '아킬레스 vs 거북' 같은 논제도 이런 분위기에서 나왔다.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난 주자는 로도스의 레오니다스. 기원전 164년에 개최된 올림픽 3관왕이었고, 그 위업을 세번이나 거듭 이뤄낸 러너다. 사람들은 그를 묘사할 때 "그는 신처럼 달렸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잘 뛰면 신의 반열에 올랐다. 지금도 그렇다. 올림픽의 월계관이 그 상징이다.
관련기사
- [달리기와 인문학 8] 내리막길 같은 삶... 달려보라, 에덴이 열린다
- [달리기와 인문학 9] 이봉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영웅이 되다
- [달리기의 기술 10] 재밌는 속도훈련 '파틀렉'을 아시나요?
- [안전한 달리기 10] '코로나 완치' 존슨 영국총리가 뛰기 시작했다
- [달리기와 인문학 10] 말아톤... 초원이... 춘마... 아, 마라톤은 인생이다
- [달리기와 진화 10] 러너스 하이, 진화가 준 '달콤한 유혹'
- [달리기와 인문학 11] 람세스2세, 즉위식에서 140m를 뛰었다
- [달리기와 인문학 13] 로마의 철인 세네카, 최고 건강비법은 달리기
- [달리기와 인문학 14]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달리기는 신성했다
- [달리기와 인문학 15] 혁명? 그냥 내가 뛰면 된다, 남들도 따라 뛴다
- [달리기와 인문학 16] 타잔은 짐승보다 빨리 뛸 수 있을까?
- [달리기와 인문학 17] '인간은 달리도록 만들어졌다'는 뼈의 증거 26가지
- [달리기와 인문학 18] 아, 차갑게 빛나는 겨울달리기의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