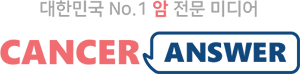아침 여섯 시, 우이동 솔밭공원의 활기찬 기운을 느낀다
서울 우이동 솔밭공원에서 하루 두 번 걷기 시작한 것은 올봄부터다. 아침 여섯 시, 공원은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 이들로 붐빈다.
맨발로 걷거나 러닝복 차림으로 힘차게 달리는 사람, 나무를 중심으로 천천히 돌며 기운을 모으는 사람, 훌라후프를 돌리거나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들, 체조 광장에서는 줌바댄스 강사를 따라 시니어들의 격렬한 율동과 신나는 노래가 공원에 울려 퍼진다.
나는 그들을 흘끗 쳐다보며 공원을 지나 도미니코수도회 성당으로 향한다. 수도자와 함께하는 미사와 성무일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엔, 어느새 줌바댄스 자리에 중후한 시니어 강사가 생활영어를 곁들여 라틴 음악에 맞춰 춤추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정겹다.
새벽부터 낮까지는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의 경쾌한 라켓 소리가 공원을 채우고, 저녁엔 가족들과 부부들까지 배드민턴 코트를 가득 메운다.

그 옆에 장기와 바둑을 두는 어르신들이 오전부터 더운 한낮까지 언제나 가득하다.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고, 엄마와 오순도순 모래성을 쌓는다. 그 곁에 앉아 있기만 해도 행복하다.
산책로에는 걷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다. 두 팔을 힘차게 휘저으며 맨발로 걷는 분,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걷는 분, 스틱에 의지하며 어색한 걸음을 힘겹게 떼는 분… 그 사이로 향긋한 소나무 향이 스며든다.
곳곳의 벤치마다 삼삼오오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들이 모두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야외 씨름판에서는 맨발로 모래 위를 걷거나 모래 장난을 하는 아이들이 보인다.
중앙 운동장에서는 농구와 축구, 자전거, 롤러스케이팅이 이어진다. 생태연못엔 거북이가, 바닥 분수대에는 물놀이에 신이 난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하다. 솔밭공원은 언제나 건강해지고 싶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공간이다.

암치료와 함께한 여름, 솔밭공원이 곁에 있었다
솔밭공원은 강북구 우이동에 3.5ha로, 100년 된 소나무 1천여 그루와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함께 자라는 서울 유일의 평지 휴양 소나무 숲이다. 사유지로, 90년대 아파트 개발 붐으로 사라질 뻔했으나 자치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양숲으로 거듭났다.
이곳을 처음 찾은 것은 살기 위해서였다. 작년 5월, 삼중음성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6월 26일 첫 항암치료를 시작하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오심·구토·복부팽만이 너무 심해 두서너 숟가락조차 삼키기 어려웠다.
결국 솔밭공원과 성당이 가까운 P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해 여름, 나는 삼복더위에도 히트텍 내복과 핫팩, 담요를 두르고 살았다. 남편은 자신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미안함으로 매일 암 환자에게 좋다는 유기농 건강식을 직접 준비해 가져왔다.
삶은 달걀, 몽땅 주스, 구운 마늘, 찐 밤호박… 하지만 난 그걸 먹지 못했다. 쌓이는 음식들을 환자들과 나누고 그대로 쓰러져 자는 날들이 많았다. 식사를 잘 못하는 날이 많아지자, 남편은 솔밭공원 옆 생선구이집을 찾아 데려갔다. 차에서 내려 걷기도 벅찼고, 생선구이 맛을 느끼기는커녕 삼키는 일도 어려웠다. 게다가 너무 추웠다.
얼른 식당에서 나와 공원 안 양지바른 벤치에 앉았다가 등받이 쪽으로 얼굴을 묻고 벌러덩 누워버렸다. 한참 멍하니 하늘을 보며 누워 있자니 냉기가 가셨다. 예전엔 식사 후 아이스커피를 마시던 게 일상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꿈만 같았다.

솔밭공원에서 다시 걷는 날, 부활의 숨결
항암치료는 점점 나를 침대에 눕히고 잠에 빠져들게 했다. 수액으로 버텨온 지 6주가 되자 면회도, 전화도 모두 거절했다. 심지어 매일 정성껏 준비해 면회 온 남편에게도 “대답할 힘도 없어,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마! 눕고 싶어, 얼른 집에 가”라고 짜증을 냈다.
항암 4회기가 끝날 무렵, 더 독한 약으로 바뀌면서 오심·구토는 통제 불가능해졌다. 5회차 항암을 간신히 다 맞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땅이 꺼지는 듯하여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둘째 분만 후 온몸이 백지장처럼 힘이 없어지고 땅이 꺼질 듯 했는데, 그 느낌이었다. ‘살 수 있을까? 수술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찾아왔다.
그러다 마침내 내게 맞는 부작용 예방약을 찾았고, 주치의에게 허락받아 요양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 뒤 구토가 점점 약해져서 물과 미음부터 이유식하듯 2개월 이상 천천히 식사량을 늘려갔다.
식사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남편과 함께 솔밭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산책로를 반 바퀴도 못 돌았다. 걷다 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다. 얼음이 녹고 봄이 오자 나는 어느 순간 혼자 걷고 있었다. 그제야 보였다.

풀잎에 맺힌 이슬방울, 햇살에 반짝이는 소나무 가지, 살랑이는 바람과 노래하는 새들, 그 사이로 조용히 앉아 시선을 끄는 고양이, 목판과 바위에 새겨진 시, 공원의 생생한 기운이 사람들의 미소 속으로 피어나는 순간들. 모든 것이 새롭고 눈부셨다.
공원 입구에는 ‘산림청 지정 명품숲’ 명패가 세워져 있었다. 회복의 걸음 속에서 하나둘 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때야 알았다. 이곳은 명품 사람들과 명품 자연이 서로를 품는 안식처라는 것을.
암을 통해 이 숲을 발견했고, 이 숲은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아마도 내가 공원 근처로 이사하고 싶은 건, 두 번째 생명을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일 것이다.
견디기 힘든 항암의 과정 속에서도 나를 붙든 건 수많은 수호천사님의 도움과 기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총이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걷는다. 나의 발걸음 속에 이미 부활의 숨결이 스며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