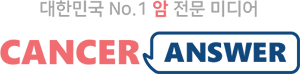태극권은 음과 양의 조화를 지향하는 도가의 철학을 배경으로 한 무술. 우리 몸의 음과 양이 어우러지면서 건강한 삶이 가능해지고, 강력한 호신의 무술이 펼쳐지게 된다.
우리는 환우의 건강회복을 위한 운동, 일반인의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태극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무술로서의 태극권 역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태극권을 소개하기 시작하는 대목에서 아주 간략하게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좋겠다.
중국 명나라 시절, 무당산의 도가 수련자들 모임인 무당파의 사조인 장삼봉 도인에 의해 틀을 갖춘 무술이 청나라 때 양로선(杨露禅,Yang Luchan,1799~1872) 선생이 정립한 '당대 최고의 무술' 또는 '당대 최고의 무술가'라는 개념을 포함해 태극권이라는 공식명칭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식태극권의 시작인데, 부드럽고 우아한 동작을 구사하고 간단한 동작들을 위주로 초식을 만들어 대중적으로 태극권을 수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이를 익힌 정만청(鄭曼靑, 1902~1975) 선생이 전통 양식태극권의 기초 위에 태극권의 정수를 간략하게 담아 만든 운동이 '정자태극권 37식'이다.
이를 '태극권 37식'이라 칭하며, 지금부터 그 초식을 하나씩 소개한다. 하나로 연결된 긴 동작이지만, 한동작 한동작이 건강을 위한 동작이어서, 따로 떼어 그 부분만 거듭해도 좋은 수련과 건강법이 될 수 있다.
이번 연재에는 기초동작인 예비식만을 소개한다.

태극권37식 (1-1) 예비식(預備式)
가만히 서서 호흡과 내공을 수련하는 '참장공'이라는 동작을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의 예비식은 참장공, 혼원공에 해당한다. 똑바로 선 때는 머리를 곧게하고, 앞을 향해 똑바로 보며 눈빛은 거둬들이고, 귀는 호흡에 집중한다. 혀끝은 윗잇몸과 입천장 상이에 핥듯이 대고, 입은 닫고 입술은 붙인다. 어깨는 가라앉히고 팔꿈치는 늘어뜨리며 가슴은 느슨히 하고, 기는 단전에 가라앉힌다.
이 간단한 동작을 하는 동안, 온몸의 안과 밖은 모두 느슨하게 늦춰져야 하고, 완전히 내려둠, 완전히 자유로움이 몸에 형성되어야 한다. 머리끝에서 발끝가지 뜻과 기가 관통하도록 하여 '내외합일'의 경기를 만들도록 노력하자. 앞으로서의 모든 초식과 건강생활이 모두 여기에서 출발한다.
①차렷자세에서 중심을 오른쪽 다리로 옮기고 약간 굽혀 견고히 앉는다. 왼쪽다리는 힘을 빼고 발뒤꿈치를 치켜든다. 동시에 양 팔꿈치와 손목을 약간 굽히면서 들어올리며 돌려 손등이 앞을 향하게 한다. 손가락은 붙이지도 벌리지도 않는다.
② 왼발을 들어 옆으로 나란히 한발 옮겨 딛고 중심을 왼발로 넘기면서 즉시 오른발 끝을 약간 들어 앞으로 향해 돌려 왼발과 평행이 되게 똑바로 딛는다. 거리는 어깨넓이와 같다.
③ 자연스럽게 무릎을 펴 똑바로 일어서며 중심을 양발에 균등히 싣는다. 이는 태극이 아직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도움말 : 대한태극권협회 이찬 명예회장
사진제공 : 이찬태극권도관
관련기사
- 치유의 태극권 (34) 여봉사폐, 장 기능 강화- 정력 증강에 효과
- 국민연예인 혜은이-박원숙을 사로잡은 태극권의 매력은?
- 치유의 태극권 (35) 환우의 심신건강 위해 고안된 테라피 타이치
- 장미희씨 가방을 들어줬던 무술배우의 추억
- 치유의 태극권 (36) 몸 풀고, 마음 가라앉히는 태극권
- 태극권의 '강유합일' 정신이 우리 삶에도 스며들기를
- 치유의 태극권(38) 손목의 미세한 변화, 관절이 활짝 열린다
- 치유의 태극권(39) 참새 꼬리 잡듯 돌고돌면 골반-척추 교정
- 치유의 태극권(40) 상대의 힘을 녹여내고, 힘을 축적해 밀어낸다
- 치유의 태극권(41) 양손을 밀어내며 하체를 튼튼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