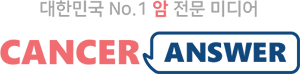만성 B형간염 환자는 혈액검사에서 간수치가 정상으로 나와도 ‘안전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혈액 검사 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혈액 속에 B형간염 바이러스(HBV)가 많이 남아 있으면 간세포가 조용히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간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14일 서울아산병원 임영석 교수팀이 한국과 대만 22개 병원에서 만성 B형간염 환자 734명을 4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자들은 간수치는 정상인데 혈중 바이러스량(HBV DNA)은 높은 비간경변성 만성 B형간염 환자였다.

여기서 말하는 간수치란 일반적으로 ALT(Alanine Aminotransferase)라는 효소의 수치를 가리킨다. ALT는 간세포가 손상될 때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효소이기 때문에 간 손상의 지표로 널리 쓰인다. 그런데 간 손상이 서서히 진행되거나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ALT가 정상으로 유지되는 ‘조용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 적용과 치료 현장에서 ALT 수치 정상 여부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환자 그룹은 치료를 안 하고경과관찰만 한 환자 그룹군보다 간암·간부전·사망 등 주요 임상 사건 발생률이 약 79% 낮았다.
연구팀은 “ALT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치료를 미루면, 바이러스가 남아 있는 일부 환자에서는 간세포 손상이 누적돼 결국 간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기준이 삼고 있는 ‘ALT 정상 여부’라는 기준이 일부 환자를 놓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적 이득도 뚜렷했다. 항바이러스제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약이어서 비용이 적지 않지만, 연구팀의 비용-효과성 분석에서는 “초기 비용을 감수해도 장기적으로는 간암·간부전 같은 고비용 합병증을 크게 줄여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감소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기 치료가 생존율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국내 만성 B형간염 환자 중 실제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비율은 약 21% 수준에 그친다. 만성 B형간염은 특히 30~60대 생산연령층에서 유병률이 높아 치료를 미루면 간경변·간암으로 이어져 막대한 의료비 손실과 조기 사망 위험을 불러오는 질환이지만, 현행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ALT 상승 여부 중심으로 적용되다 보니 바이러스가 많이 남아 있어도 ‘간수치가 정상’이라는 이유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환자가 적지 않다.
임영석 교수팀은 “이제는 ALT보다 혈중 바이러스량(HBV DNA)을 중심으로 치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40대 이상 환자는 조기 치료의 이득이 더 커 급여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형간염이 있는 사람은 HBV DNA(바이러스량), HBeAg 여부, 간섬유화 정도(초음파·섬유화스캔), 가족력 등 간암 위험 인자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바이러스 억제가 잘 되더라도 간암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간초음파+AFP 혈액검사를 받는 게 좋다.
현재 항바이러스제로 쓰는 바라크루드, 비리어드, 베믈리디는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1차치료제로 폭넓게 권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