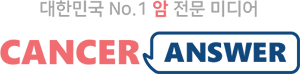학창 시절 남자친구가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강으로 분주한 25학번 딸아이는 그런 나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고등학생 때는 남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꽃과 향수를 받아오더니 대학에 와서는 어버이날에 남자친구를 시켜 내게 카네이션 선물을 하게 했다. 그래서일까, 요즘 딸아이를 찬찬히 보고 있노라면 신기할 때가 많고 조금은 부럽기도 하다.
이성 친구를 사귀는 일은 나에게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다.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수많은 정보와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의 나열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 읽었던 막스 뮐러의 ‘독일인의 사랑’은 오히려 나를 연애에 대한 끝없는 질문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 같다.

"진짜 함께 있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
그 문장은 나를 한동안 깊은 고민 속에 머물게 했다.
‘상대의 영혼과 함께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상대방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붙들어 함께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걸 알아볼 수는 있는 걸까?’
그런 철없는 물음은 연애라는 세계를 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종교적인 영향과 소심한 성격까지 더해져 막연한 두려움과 조심성들이 뿜어내는 냉기가 이성 친구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런 나에게도 연애가 시작될 뻔했던 순간이 한 번 있었다. 늦은 밤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시각. 어디선가 한 남학생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순간 당황한 나는, 마침 저 멀리 창문 너머로 엄마가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아무 번호나 눌러주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내게 핸드폰을 내밀던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외였다. 처음 보는 여자를 불러 세울만한 배짱은 어디 가고 이렇게 떨고 있는 걸까? 그렇게 자신있게 다가와 거침없이 말도 잘하던 그가, 정작 휴대전화를 건네는 순간에는 태풍 속 연한 나뭇가지처럼 손이 흔들리고 있다니...

그 시절의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툴고 조심스러웠다. 그 순간, 나와 비슷하게 소심했을 그의 순수함과 우리의 풋풋했던 시간들이 가끔은 불현듯 그립다.
9월이 되니 숨통을 조여오던 무더위도 한 발짝 물러서고 기억 저 너머 어딘가에 담아 두었던 기분 좋은 추억 하나 꺼내 볼 여유가 생겨난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런 계절의 작은 틈이 참 고맙다.
살다 보면, 퍽퍽한 날들이 예고 없이 우리 삶에 스며들기도 한다. 그러할지라도,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렇지’라는 사람살이의 정을 품고, 조금 더 느긋하고 관대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