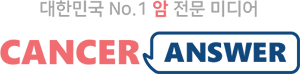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오히려 암을 유도하는 ‘배신자’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박영민 교수 연구팀은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와 공동으로, 두경부암의 조기 발생을 유도하는 핵심 유전자로 MLL3를 지목하고 그 기전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편평상피세포암종 환자 72명의 다중 종양 샘플 323개를 분석한 결과, MLL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초기 전암성 병변이 침습성 암으로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입증했다. MLL3는 본래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돌연변이를 통해 그 기능이 상실되면 오히려 암 형성을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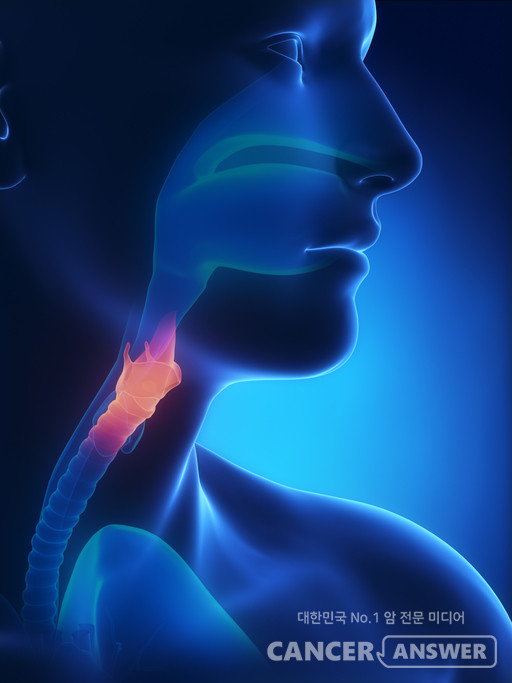
편평상피세포암종은 상부소화기와 두경부 부위에서 흔히 발생하며, 치료가 어렵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난치암이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질환의 발생 기전을 유전자 수준에서 설명한 최초의 사례로 주목된다.
연구팀은 특히 세계 최초로 3차원 두경부 전암 오가노이드 모델을 개발해, 암 발생의 과정을 실험적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인간과 쥐의 구강조직에서 추출한 정상 편평상피세포를 크리스퍼(CRISPR) 유전자 조작 기술로 조절, MLL3 기능 상실이 어떻게 암 전환을 유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후생유전학적 분석을 통해 MLL3가 GRHL2 단백질과 함께 유전자 조절 영역인 인핸서(enhancer)에 작용해, 항종양 면역 반응과 림프구 침윤을 조절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MLL3 유전자 돌연변이가 면역항암제에 대한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분자적 근거를 제공하며, 향후 면역치료 반응 예측에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민 교수는 “MLL3 유전자 돌연변이가 두경부암의 조기 발생과 면역항암제 효과 저하에 관여하는 기전을 동물 모델을 통해 입증했다”며,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면역항암 치료 전략 수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