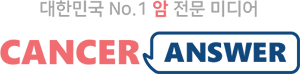요즘 금요일을 기다려 꼭 챙겨보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다.
아이유(엄마 애순, 딸 금명 역)와 박보검(양관식 역), 문소리(엄마 애순역) 등이 나오는 ‘폭싹 속았수다’다.

제주의 말과 사람, 시대의 공기와 가족의 삶이 한데 어우러진 이 드라마는
단순한 이야기를 넘어 마음의 심연을 건드리는 힘을 갖고 있다.
드라마를 보며 느끼는 감정은 하나로 표현할 수 없다.
따뜻했다가 억울하고, 울다가 웃고, 부러움과 분노가 뒤엉킨다.
그만큼 이 드라마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기억과 상처, 그리움을 자극한다.

그 중에서도 나는 금명의 아버지 양관식의 한 대사에 마음이 오래 머물렀다.
“금명아! 해, 다 해! 아버지 아직 여기 있잖아~.”
이 말이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나는 속으로 내 이름을 넣어 조용히 읊조려 보았다.
“정희야, 해 다 해. 나 여기 있어.”
그 말 한 마디에 이상하리 만치 따뜻함이 벅차올랐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지지, 따뜻한 보살핌이다.
이 세 가지는 ‘심리적 3대 영양소’라고도 부를 수 있다.
발달심리학자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에 따르면,
아기는 ‘신뢰 대 불신’이라는 생애 초기 발달단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일관된 돌봄을 받을 때
세상을 신뢰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불안정한 애착과 심리적 결핍을 갖게 된다.
즉,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고 지지받은 경험은
평생의 정서적 면역력으로 작용한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자란다는 점이다.
결핍은 흔적을 남긴다.
눈치 보기, 과잉 책임감, 자기 비하와 같은 감정의 패턴은
대부분 이 시기의 결핍에서 비롯된다.
마치 영양 부족이 면역력을 약화시키듯,
심리적 영양 결핍은 내면의 안전 기제를 약화시킨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지해준 단 한 사람.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고 있는가?

드라마 속 금명이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며,
삶의 위기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그런 힘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녀의 어머니 애순은 비록 가난하고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삶의 고난 앞에서 움츠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시절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주체적인 태도로 삶을 견뎌냈고,
그 안에서 딸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지지를 전해주었다.

애순에게도 ‘그 한 사람’이 있었다.
딸을 위해 바다에서 전복을 건져 올리며 험한 삶을 살아낸
그녀의 어머니 광례(염혜란 역) 말이다.
드라마는 말한다.
사랑과 보살핌은 환경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고.
삶이 만만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주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때로는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결핍을 품고,
때로는 그 결핍을 누군가에게 또 대물림하며.
하지만 회복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온다.
“해 다 해. 아버지 아직 여기 있잖아.”
그 말을 내 안의 작은 아이에게 건넬 수 있다면,
혹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단절이 아닌 연결의 사람,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