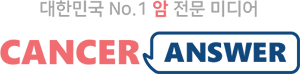항암 면역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로 장내 미생물 환경의 변화를 주목한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내 미생물 환경과 ‘PD-L2’ ‘RGMb (repulsive guidance molecule b)’ 두 가지 물질이 체내 면역체계의 활성화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포착됐다. PD-1 및 PD-L1 계열 면역관문억제제(면역항암제)의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치료 내성 환자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데니스 캐스퍼 교수와 고든 프리먼 교수팀이 진행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관련 면역치료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온라인판에 최근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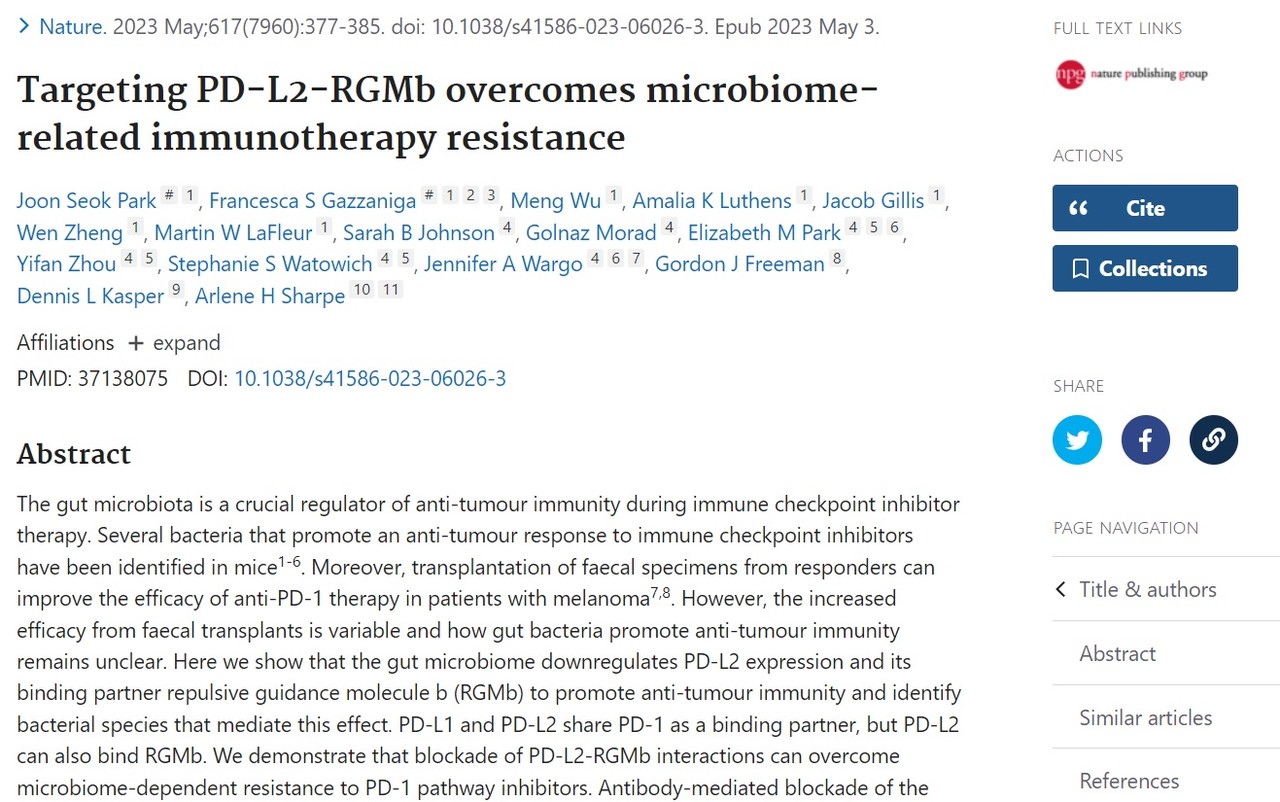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미생물들로 이뤄진 생태환경을 말한다. 이들 미생물 중 대부분은 위장관에 존재하며 뇌 및 간, 폐 등의 주요 장기에 발생하는 질환과도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선 장관 내에 존재하는 세균과 곰팡이 등의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에 따라 면역치료에 성과가 갈릴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하버드의대 박준석 박사는 “면역치료의 복잡한 수수께끼를 푸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며 “암 환자 면역요법의 효과를 강화하고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면역체계가 암과 싸우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조정을 통해 기존 항암 면역요법에 대한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구를 살펴보면, 암 환자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채집해 실험용 쥐의 장에 주입했다. 이때 암 환자들에서 추출한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치료에 반응률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환자의 것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실험용 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관찰됐다. 면역치료에 잘 반응하는 환자의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입한 실험용 쥐에서는 항원제시세포(APC)에 PD-L2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장내 세균을 항생제로 치료한 경우에서도 면역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 RGMb 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지목했다. 해당 실험용 쥐에 RGMb의 활동을 억제하는 항체를 투여하자, 암을 사멸시키는 세포가 만들어졌고 건강 상태가 개선됐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의 양과 RGMb 수치 사이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며 “장내 미생물이 충분한 경우 RGMb 수치가 낮았고 면역치료에 더 나은 반응률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