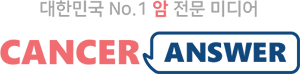갈등을 일삼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개인 잡지에 이런 광고를 실었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호텔 앞에서 만나자. 아빠는 너를 다 용서했다." 그러자 화요일 12시에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이나 되는 청년이 모여 들었고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민간 기병대가 투입됐을 정도였답니다.(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세상의 수도' 중)

파코라는 이름은 프란체스코라는 이름의 애칭으로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만, 용서를 받고 싶어하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도 느끼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대상입니다. 함부로 "용서해 주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 상처를 가족에게 받은 경우도 허다합니다. 용서는 당한 사람만 해 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상처를 준 쪽이 "용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기다리는거죠.
긴 여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때론 "가족이니 용서해주어라, 네가 다 이해해 주지 않으면 어쩌겠니?"라는 말이 더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설사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해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일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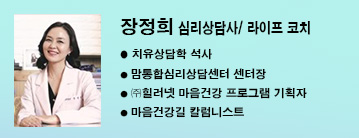
관련기사
장정희 기자
jane92ru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