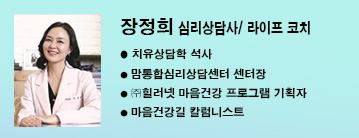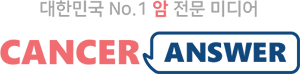사람에겐 누구나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둘 정도는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도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저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다가 쑥 하고 고개를 내밀며 일상을 뒤흔든다면, 그건 트라우마입니다.
제 절친의 이야기입니다. 유난히 추웠던 지난 1월 어느 날 아침,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울 아버지가 여기 혼자 계시네~."
울먹이는 친구의 음성에 잠이 달아났습니다. 친구는 2년 전 돌아가신 선친의 산소에 갔다가 생전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셨던 선친을 떠올리며 캔 커피 하나 올리고는 울먹이며 전화를 한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선친 기일이 다가오면 친구는 2년 전의 병원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모양입니다. 선친께서 폐결핵 치료를 받기 위해 격리치료 병동으로 입원하던 날. 유난히 병원을 싫어하셨고, 폐결핵 약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홀로 병실에서 투병해야 하는 상황을 못 견뎌 하셨던 선친에게 점식 식사로 도시락을 사드리면서 친구가 내뱉은 말 한 마디. “아버지 강해지셔야 해요~.” 그리고 선친은 격리치료 병동에 입원하자마자 곧바로 심장 이상으로 의식을 잃었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회한 없는 사별, 이별이 어디 있을까 싶네요. 가족이 먼저 돌아가시면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아쉬움만 남는다고 합니다. 친구도 자신의 말투가 너무 냉정했다고 자책합니다. 선친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드렸어야 했는데, 입원 치료라는 현실만 마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해줬지만, 친구는 “그러지 말아야 했다”고 계속 울먹거렸습니다. 몇 마디 더 위로를 건네고 전화를 끊었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내담 고객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친구는 선친에게 어떻게 말했어야 했을까? 입원을 앞두고 걱정과 온갖 상념에 빠진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어야 했을까?
"아버지 힘드시죠? 지난번 입원하셨을 때 일인실에서 많이 외로우셨죠. 얼마나 힘드실지 잘 알아요. 걱정 마세요. 아들이 옆에 계속 있어 드리지는 못하지만 매일 들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따뜻하게 안아드렸더라면… 친구는 그러지 못했던 걸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부드럽게!
살면서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그러는 게 서로 좋다는 걸, 다 알지만 그게 잘 안되죠. 사실 말투만 바꿔도 후회할 일이 많이 줄어들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