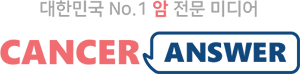영춘화(迎春花)가 피었습니다.
여기 한송이, 저기 한송이, 힘겹게.
꽃 중에서 가장 먼저 봄을 맞이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영춘화.
조선시대 장원급제자의 머리에 꽂아 '어사화'라 불렸고,
매화와 거의 같은 시기에 피어 봄을 맞았기에 '황매(黃梅)'라고도 하죠.
봄의 전령답게 희망, 사모의 마음이 꽃말입니다.

아직은 차가운 바람끝이 남아있는 2월의 마지막 주.
햇살 따사로운 천변길에 드문드문 피어, 봄을 내다봅니다.
초록 물들기 시작한 줄기 끝에 수줍게 머리를 내밀고,
노랗게 여섯잎 꽃잎으로 힘겹게 먼저온 봄을 소리칩니다.
바로 앞 저기에 봄이 성큼 다가와 있다고.
겨울이 아무리 거칠어도 생명의 봄은 온다고.

지독한 미세먼지도, 희뿌연 안개도 없는 화창한 날,
자세히 보아야 보이는 수줍은 봄꽃,
멈춰서 공들여야 찾아지는 영춘화.
딱 그런만큼만 봄이 다가와 섰습니다 .
딱 그 정도만 희망의 날이 다가와 머물고 있습니다.
추위에 지쳐 종종걸음 치면 결코 만날 수 없는 희망입니다.

이름과 꽃말과 계절이 딱 맞는 꽃, 영춘화.
김춘수 시인의 아름다운 시 <꽃>이
저절로 읊조려지는 늦은 겨울 한낮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