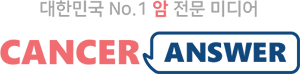앗 차가워, 오늘 아침.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낙엽이 지기 시작했어요.
길고 지루하던 장마와 여름이 끝나고, 가을인가 싶더니 설마, 겨울?
10월말의 주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빨갛게 빛나는 낙엽이 푸른 채 떨어진 잎새와 함께 뒹굴어요.

계절의 뒤섞임, 바닥만 그런 것이 아니네요.
나무들도 그래요.
한쪽은 빨갛게 불타고, 한쪽은 푸르게 꼿꼿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어느 나무는 단풍을 만들고, 어느 나무는 상록을 더 빛나게 하죠.
알 수 없게 뒤섞인 세상도 그러하겠죠.



벤치에도, 야외차단벽에도, 고랑에서 가을색이 짙어졌어요,
성큼, 계절이 깊어갑니다.
이렇게 빨리 변하는 계절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자연의 섭리,
그 자연스러움의 당연함을 못받아들이는 우리가 문제겠죠.

눈부시게 부서지는 햇살을 바라보며
늦은 오후 가로수 길을 걸어가노라면
늘 따라 걷는 긴 그림자도
가을을 지나 겨울을 걷는다
옷깃을 여민 여인네들의 긴 옷 사이로
햇살은 무수리 깨어져 구르고
조경으로 심은 대로변 국화엔
벌들이 아직도 한 세상인데
문득, 먼 곳의 사람이 된
늦가을을 좋아하던 그대가
생각나는 시월의 마지막 날
이파리 떨구는 가로수 사이로
한잎 두잎 부서지는 햇살을 따라
그대의 또랑한 눈망울도
가을을 지나 겨울로 깊어만 간다
남경식 <시월의 마지막 날> 중에서
최윤호 기자
uknow2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