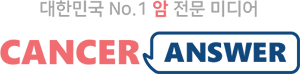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 놓고 밖에 나가기 힘들다. 혹시 면역력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나도 몰래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집안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마음 공부도 하지만, 갑갑한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있다. 코로나19가 닥쳐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함께 어울리는 환우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들로 자주 다녔다. 어깨가 아프다면 주물러 주고, 요즘 컨디션은 어떤지 물어주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동지들이다. 전화로 수다를 떨지만, 이 봄을 함께 즐기지 못해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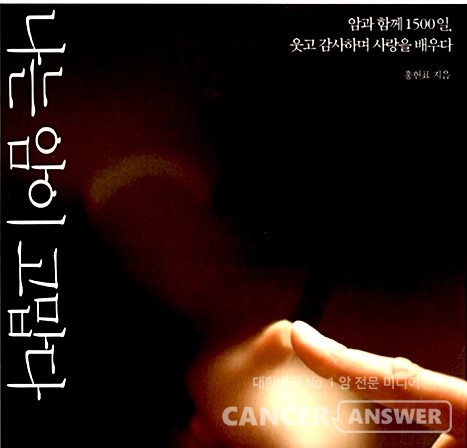
내가 암에 걸리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는지 묻는다면, 나는 내 마음이라고 대답한다. 근심, 걱정, 우울, 화, 분노, 원망 같은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암 진단 이전에 10이었다면 지금은 1 정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암 치유 과정에서 내가 이렇게 바뀐 것이다.
돌이켜보면 내가 암환자가 된 원인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였다. 남편 일이 안 풀려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내가 우리 집 경제를 책임져야 했다. 생활비와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남편은 부정적이었고 매사 회의적이었으며 생각도 보수적이었다. 나는 며느리, 아내, 엄마,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역할을 다 끌어안고 살았다. 성격도 안 맞다 보니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고 하루 하루를 우울감 속에서 지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싫을 정도였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암이 내 마음을 바꿨다. 위암 치료를 받을 때는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보냈다. 옷을 버리고 집안 정리를 하면서 납골당에 갈까, 수목장을 해달라고 할까 하며 죽을 준비를 했다.
그런데 유방암 진단을 받은 뒤, 손주들과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 먹으려고 노력했다. 심호흡을 하기, 감사기도 하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실천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든다. 아침에 일어나면 비몽사몽간에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선물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행복하게 보낸 것에 대해 또 감사한다. 하다 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죽음을 생각하니 거꾸로 살아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위를 잘라냈는데도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숨을 내 맘대로 쉴 수 잇는 것도, 웃음보따리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게 다 감사할 뿐이다.
돈이 누구보다 더 적다고 불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이전에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았는데, 욕심 때문에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살았다는 걸, 암에 걸리고 나서 한참 뒤에야 깨달았다.
남편도 많이 바뀌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그냥 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해보니 남편이 달라지더라. 물론 근본적인 성격까지는 안 바뀌지만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다.
암 진단 초기만 해도 나는 시댁을 자주 오가며 시부모님을 챙겼다. 이제는 안 그래도 된다. 남편이 어느 날 내게 말했다. “이젠 내 걱정, 우리 집안 걱정 하지 말고 당신 편한 대로 이기적으로 살아.” 그러곤 시댁에는 얼씬도 못하게 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나를 살렸다. 내가 삶을 포기하다시피 했을 때 환우 카페를 뒤지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가며 나를 살리려고 애를 쓴 사람이다. ‘저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이 세상에 없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남편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전히 집안 일은 안 돕고 게으르고 가끔 화도 내지만 다 용서가 된다. 웃음보따리 이장님의 책 제목이 ‘나는 암이 고맙다’인데,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만약 다시 내게 암이 생기더라도 나는 잘 살아낼 자신이 있다.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병원 치료의 도움을 최대한 받겠지만, 내 스스로 방법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깨달은 것은 의사 선생님이 내 몸을 낫게 도울 수는 있지만, 온전히 낫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건 순전히 내 몫이다.
이 체험 수기는 최은애(가명, 56세)님과 인터뷰 한 내용을 본인 동의를 얻어 재구성한 것입니다. 최은애 님은 2014년 위암 3기로 위 전절제 수술을 받았고, 2016년엔 유방암으로 수술 등 치료를 받고 5년 완전관해 판정을 1년여 앞두고 있습니다.